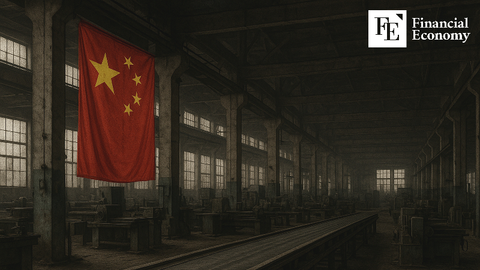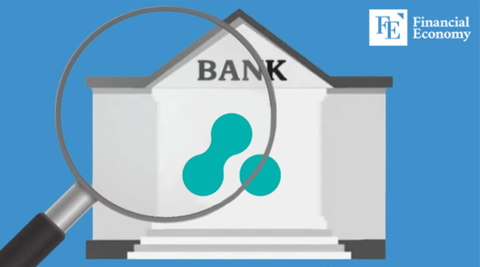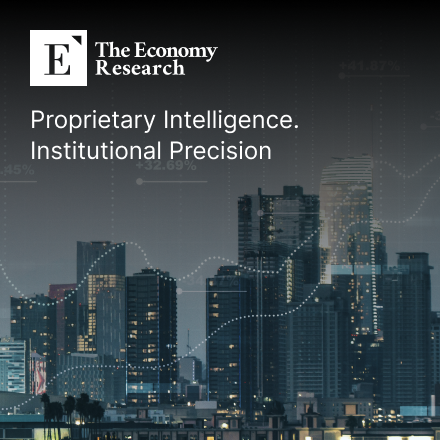입력
수정

독일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도산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건축 자재값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업계에선 독일의 '역성장' 위기와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이미 과거부터 관측됐던 만큼, 이같은 독일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편 높은 수익률을 이유로 독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 또한 독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위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부동산 호황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독일
3일(현지 시간) 모리츠 슐라릭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독일의 10~15년에 걸친 부동산 호황은 끝자락에 놓여 있다"며 "독일 부동산 개발업체는 날마다 파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 부동산 개발사들이 금리 상승, 노동력 부족, 신규 개발 수요 둔화, 건축 자재 가격 상승 등 잇단 악재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독일 정부가 신축 건물에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한 게 신규 개발 공급을 가로막고 부동산 침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봄 이후 부동산 건설 시장은 러-우 전쟁으로 산업 환경이 냉각되면서 주문 취소, 새로운 주문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6월엔 전체 건설 주문의 19.2%, 7월엔 18.9%가 주문을 취소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독일 경제연구소 ifo의 7월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업체의 40.3%가 주문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년 전(10.8%)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취임 당시 연간 약 40만 채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독일 주택 공급량은 작년 말 기준 총 29만5,300채에 그쳤고, 올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 건설 허가를 받은 아파트 공급량은 13만5,200채로 작년 동기 대비 27% 줄어든 모양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주 사이,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게르히, 뮌헨의 유로보덴, 센트룸그룹 개발파트너, 뉘른베르크의 프로젝트이모빌리엔그룹 등 상당한 수의 독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라운드타운, 보노비아 등 대형 임대 업체들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는 지난 8월 29일(현지 시간) 연간 70억 유로(약 10조1,235억원)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통과와 함께, 자국 건설업체 투자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규칙 완화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으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한 건설업 관계자는 "이 규칙 개정은 바다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 꼴"이라며 "유동성 확대를 위해선 현재 신축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에너지 효율성 기준 완화,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공공 소유 주택 조합에 대한 투자 허용 등을 통해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를 재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성장 위기와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불러온 예견된 수순
전문가들 사이에선 독일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우 전쟁 이후 독일의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데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 흐름이 가세함에 따라 독일 경제가 '역성장' 위기가 강하게 점쳐졌던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 또한 급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독일을 비롯한 서방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끊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독일의 화학, 금속 등 에너지집약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가계 실질 구매력도 점차 위축세에 접어들었다. 또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자국 부동산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독일 무역 수지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독일은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대부분 전자기계, 자동차 등 기존 산업에 집중돼 있는 반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전기차·자율주행으로 전환되는 만큼 내연기관 중심의 자국 제조업 경쟁력이 점차 도태돼 가고 있는 게 현 독일의 상황이다. 특히 독일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로 인해 고숙련 근로자는 적고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으로 구조가 바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종국적으로 독일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촉발됐다. 미국과 유럽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차입 비용 상승과 주식 가치 폭락으로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원격근무에 따른 사무실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 자체도 떨어지게 됐고, 상업용 부동산 회사의 기업어음(CP) 등 관련 자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독일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덩달아 디폴트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와 베를린 등의 주요 업무용 빌딩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30% 이상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펀드에도 적잖은 손해 미칠 것으로 예상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펀드에도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증권사·시중은행 등이 설정한 해외 부동산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71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 불었던 부동산 투자 열풍 속에 관련 펀드 규모가 2013년 말 5조원보다 14배 이상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펀드가 주로 투자한 상품이 최근 미국·독일·중국·일본 등지에서 공실률이 치솟고 있는 업무용 빌딩인 만큼, 앞서 살펴본 독일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라 국내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독일 상업용 빌딩에 투자해 최대 연 7.5%의 배당수익률로 화제를 모았던 국내 E자산운용은 지난 2월부터 배당금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공실이 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매가격 또한 20% 이상 추락하면서 올해 10월 만기를 앞두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발맞춰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빌딩 투자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좁아진 시장 참여자들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을 잃고 자금을 대거 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0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의 캡레이트(Cap rate)와 국채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250~300bp였지만, 올해 1분기는 100bp 미만으로 좁혀진 모습이다. 캡레이트는 매입 비용 대비 임대순수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익이 비슷하다면 안전성이 더 높은 국채에 투자하지, 리스크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소한 올 하반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독일의 수순을 따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국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자산 매입에 나설 것이란 조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컬리어스는 "달러 강세에 힘입어 자본력이 높아진 외국계 기관들이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CBD와 GBD 권역에 재개발을 통한 기존권역 확장이 기대되는 데다 기존 도심 권역의 경우도 신규 공급과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등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대거 주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