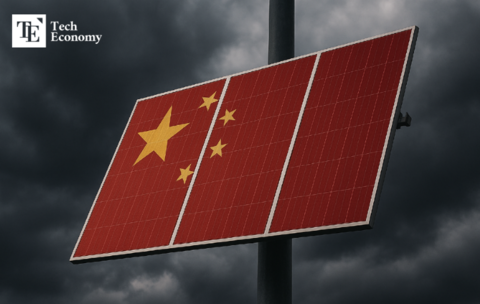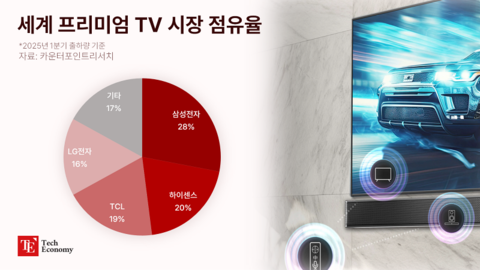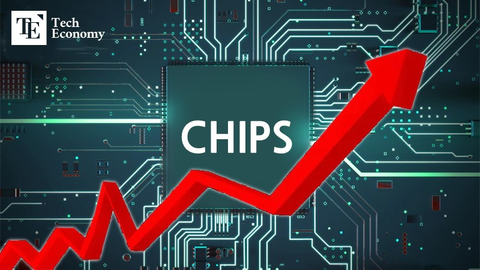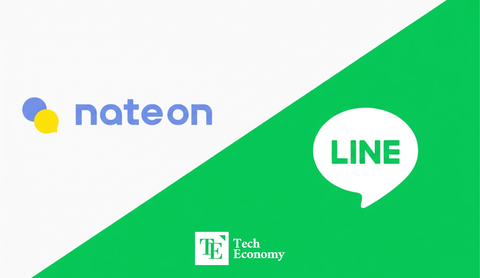“중국에 시장 다 내줬다” 저가 공세에 한국 태양광 기업들 ‘백기’
입력
수정
중국에 韓 태양광 산업 잠식 국내 공급망도 뿌리째 흔들려 가격 경쟁 이어 품질서도 밀린 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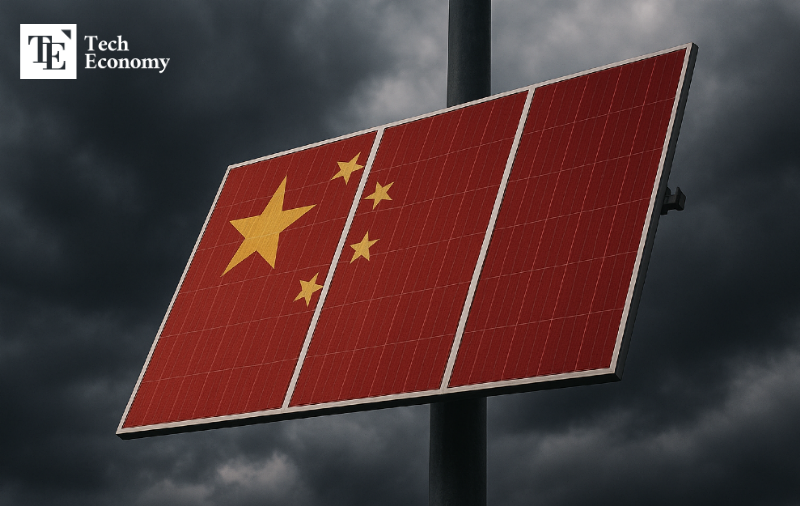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전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95%를 넘어섰다. 5년 전만 해도 50% 달하던 한국산 셀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중국산의 공세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값싼 태양광 모듈(패널)에 이어 기술집약적인 셀까지 중국이 장악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가격뿐 아니라 기술에서조차 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韓 기업 태양광 셀 점유율 4% 불과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8%에서 2021년 63%, 2023년 74%를 거쳐 지난해 95%까지 치솟았다. 반면 한국산 태양광 셀의 점유율은 2019년 50%에서 2021년 35%, 2023년 25%로 주저앉다가 지난해엔 4%로 급락했다. 한국산 셀의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한 건 처음이다. 한국 태양광 시장 일부를 차지했던 대만·미국·일본·싱가포르산 셀은 2019년 점유율이 11%였지만 지난해엔 0.1% 미만을 기록하며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중국산 셀이 한국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판은 폴리실리콘(원재료)→잉곳·웨이퍼(부품)→셀→ 모듈(셀을 모아놓은 패널) 순서로 생산된다. 이 중 셀은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핵심 부품이다. 모듈은 여러 개 셀을 노동집약적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반면 셀은 빛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는지로 품질이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부품이다.
한국 태양광 시장은 값싼 중국산 모듈의 공세로 국산 점유율이 하락해 왔다. 하지만 셀 시장마저 중국산이 장악했다는 건 가격 경쟁력 차원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한 태양광 기업 관계자는 “모듈 시장을 내준 건 싸게 만들지 못한 탓이지만 셀 시장을 내준 건 기술력에서도 밀렸기 때문”이라며 “한국 태양광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태양광 산업은 저가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서로 다른 파장을 흡수하는 두 겹의 태양전지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초고율 탠덤(Tandem) 셀 분야에서도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망도 붕괴 직전
기초 소재 부문 사정도 다르지 않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드는 첫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국내 업체는 사실상 전무하다. 2014년 삼성정밀화학이 이 사업에서 손을 뗀 데 이어, 2020년에는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인 OCI와 한화솔루션(한화큐셀)마저 국내 생산을 중단했다. 값싼 전기 요금과 인건비, 막대한 자국 시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치킨게임’ 탓에 글로벌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이상 국내 생산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공급망이 무너지자 그 여파는 잉곳·웨이퍼 시장으로까지 번졌다. 2010년대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던 웅진에너지가 2022년 결국 파산한 것이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를 활용해 만드는 태양광 셀과 모듈 등 완제품 관련 기업도 차례로 타격을 받았다. 해당 분야 대표 기업인 LG전자 2022년 태양광 모듈 생산 시작 12년 만에 손을 뗀 것이 대표적이다. 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며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여파였다.
그나마 살아남은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한국 사업은 축소하고 중국산 공세를 피할 수 있는 미국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잉곳·웨이퍼·셀·모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솔라 허브’를 구축 중이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노린 전략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향후 미국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7월 통과된 감세 법안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설비 보조금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태양광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산업 육성보다 보급에만 방점, 품질·가격경쟁력도 악화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전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95%를 넘어섰다. 5년 전만 해도 50% 달하던 한국산 셀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중국산의 공세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값싼 태양광 모듈(패널)에 이어 기술집약적인 셀까지 중국이 장악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가격뿐 아니라 기술에서조차 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올려 잡은 점도 중국산 장악을 부추겼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위주로 정책을 설계해 국내 업체들을 고사 직전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내에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끝낸 다음에 태양광 보급을 늘린 게 아니라 국산, 외국산 구분 없이 보급 실적 위주로 정책을 펼쳤다”며 “그러다보니 국내 산업이 붕괴됐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보다 더 근본적 원인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중국 기업이며, 1위 통웨이부터 5위 진코까지 모두 중국 회사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세계 4위 태양광 모듈제조업체인 론지솔라의 연간 R&D 비용은 1조3,000억원으로,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3,217억원)의 4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면서 공급망 독점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중국 정부가 희토류처럼 태양광 패널을 전략 자산화하거나 가격을 급격히 올릴 경우 사실상 손쓸 대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