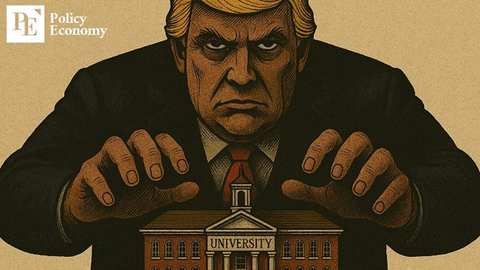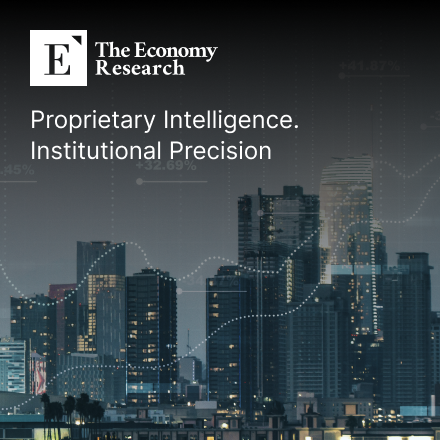입력
수정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에 있는 공공 정책 기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연설을 통해 국가 안보와 산업정책이 미국 무역의 길잡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단절이 아닌 ‘탈위험(de-risking)’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새로운 합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장 지향적이었던 과거의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 국가보안법은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는, 규제 범위를 줄이는 대신 그 강도를 높이겠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즉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 대신 ‘공정한 경쟁의 장’을 통한 개입을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폴레옹의 명언인 ‘벨벳 장갑 속의 강철 주먹’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에는 신중상주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무역 협정은 미국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노동자가 아닌 부유한 미국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중상주의에서는 산업정책을 소외된 부문의 혁신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여깁니다. 아울러 동맹국들이 언제나, 심지어 미국 해안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때도 미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수용해야 하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국가 안보가 시장의 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중상주의자들은 이번 연설에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독립 칼럼니스트인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Clyde Prestowitz)는 미국이 자유 무역과 세계주의 정책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며 찬사를 보냈고, 뉴욕 루스벨트 연구소의 토드 터커(Todd Tucker)는 설리번 보좌관이 산업정책을 수용하고 ‘죽어가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 정책 연구소 아메리칸 프로그레스(American Progress)의 오렌 캐스(Oren Cass)는 "관계 단절은 필수적"이라며 설리번 보좌관이 국가 안보와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그 지지 세력은 근본적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사실 전쟁 이후의 무역 자유화는 교통 및 통신 분야에서의 혁명과 더불어 수십억 명의 생활 수준을 높인 데다, 미국은 현재 무역을 통해 매년 2조 달러 이상, GDP의 약 10%에 달하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미국인은 무역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선정된 기업에 막대한 산업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미국의 성장이 빨라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이 아닌,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견해를 따라 ‘21세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대 무역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자유 무역 협정과는 반대로 △녹색 에너지 육성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과 개방성 보장 △법인세 인하 경쟁 회피 △노동 및 환경 보호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안은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주도해 결성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IPEF에는 이들이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나 집행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 인하는 협상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심지어 존스법(Jones Act; 미국 항구에서 다른 미국 항구로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법) 예외 처리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미국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을 시행할 때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을 의무로 한 규정) 면제 같은 시장 접근 조항(market access provisions)도 배제됐습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IPEF의 출범 직후 대만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만은 미국과의 병행 협정을 최종적인 자유 무역 협정의 ‘구성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그간의 경제 교류 공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정 초안에는 농장 무역의 장벽을 낮추거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는 방안은 물론,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완화하는 등 앞서 언급한 시장 접근 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한 이래 현재까지 자유 무역의 최우선 지향점은 국가 안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보를 위해 자유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해야 하는지는 여전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국가, 회사, 제품, 기술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의 판단은 공공은 물론 사법 조사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마당’을 좁게 설정했을지 몰라도, 예컨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된다면 마당은 아주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의 의제와 무역 전선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약 18개월 뒤인 내년 11월에는 미국 차기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활용해 세계무역기구(WTO) 의제를 홍보하고, 우크라이나 방어라는 목표를 세계 경제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설리번 보좌관은 WTO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원칙을 존중하는 규칙 기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가로 제시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s turn to neo-mercantilism
Speaking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in April 2023,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declared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policy as the guiding lights for US trade. Sullivan couched his prescriptions in soft tones and catchy phrases. ‘Decoupling’ is out, ‘de-risking’ is in.
The goal is to ‘forge a new consensus’ — something different to the market-oriented Washington Consensus of yesteryear. National security restrictions have their limits set in a ‘small yard, high fence’. US security is not trying to engage in a ‘technology blockade’ against China but rather on a ‘level playing field’. The phrasing recalls Napoleon’s remark of an ‘iron fist in a velvet glove’.
Embedded in Sullivan’s remarks were familiar neo-mercantilist themes. These include that post-Second World War trade agreements did little to improve US life and, at most, only enriched wealthy Americans instead of working people. Neo-mercantilist themes also suggest that industrial policy is essential to spark innovation in neglected sectors. They emphasise that allies should accept heavy US subsidies even when they attract private investment to US shores and that national security, broadly defined, must take precedence over market forces.
Not surprisingly, Sullivan’s speech brought cheers from the deacons of neo-mercantilism. Clyde Prestowitz, an independent columnist, applauded Sullivan for turning his back on free trade and globalist policies. Todd Tucker of the Roosevelt Institute warmly endorsed Sullivan for embracing industrial policy and ‘moving away from a moribund neoliberalism’. Oren Cass of American Progress quibbled that ‘decoupling is essential’ and admonished Sullivan for not carrying the ascendancy of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policy far enough.
Sullivan and his supporters dismiss fundamental facts. Post-war liberalisation, accompanied by revolution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raised living standards for billions of people. Gains to the United States alone now amount to more than US$2 trillion annually, some 10 per cent of GDP. Despite its declining popularity, trade still commands majority support among Americans. Massive industrial subsidies that are awarded to select firms may fail to accelerate growth in the United States. Intense competition between leading firms — whether domestic or foreign — seems the better formula.
If the United States cares about its global leadership role, neoliberalism is far superior to neo-mercantilism.
Echoing US Trade Ambassador Katherine Tai, Sullivan proposed ‘modern trade agreements’ — as opposed to old-fashioned free trade agreements — to achieve ‘21st century goals’. Those goals are to foster green energy, ensure safety and openness in digital infrastructure, avoid a race to the bottom in corporate taxation, protect labour and the environment and tackle corruption.
The avatar of ‘modern trade agreements’ is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 agreement that contemplates neither economic incentives nor enforcement mechanisms to achieve the goals commended by Sullivan and Tai. Tariff cuts are not on the table. By implication, market access provisions such as Buy America waivers and exceptions to the Jones Act — which requires goods shipped between US ports to be transported solely on US ships — have also been ruled out.
As if to emphasise the economic vacuum, Taiwan characterised its parallel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s a ‘building block’ to an eventual free trade agreement. But nothing in the draft agreement lowers barriers to farm trade, reduces tariffs on manufactured goods, or relaxes Buy America regulations. Such market access provisions are high on Taiwan’s wish list.
From Adam Smith in 1776 to the present, free traders accept the primacy of national security. But the eternal question is about the proper domain of restrictions. US decisions as to whether a country, company, product or technology threatens US national security are shielded both from public and judicial scrutiny and deliberately ignore economic costs. As long as Sullivan is National Security Advisor, the yard may remain small, but his successor could have expansive views — especially if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elected to a second term.
US President Joe Biden has successfully enacted his domestic agenda and further legislative action on the trade front and now awaits the president elected in November 2024. This should be a moment for Biden to use his presidential powers to promote an ambitious World Trade Organization agenda. For the next 18 months, Biden should thereby add the world economy to his justified focus on Ukrainian defences.
Yet Sullivan gave only a weak nod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ullivan’s words conveyed no call for US leadership in building a rules-based trading system respecting market principles. But Sullivan’s remarks should not be the last we hear from President Biden on US policy towards the glob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