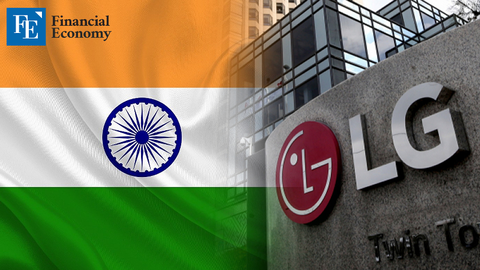험난한 ELS 배상 길, 금융권 '배임 우려' 목소리도 크지만 "과징금 폭탄 피하려면 자율 배상 불가피"
입력
수정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도마, 금융당국 vs 금융권 '격돌' 주관적 판단 개입 우려에 배임 가능성까지,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 각종 논란에도 금융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 배상해야 할 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상 규모가 1~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사 측이 배임 이슈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당국의 배상안을 곧이곧대로 따르더라도 자율배상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사례별로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도미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나왔지만, 금융권 "배임 우려 있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크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투자자가 가장 빠르게 배상받는 경우는 분조위가 다루는 대표 분쟁조정 사례로 선정돼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분조위 결정은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인 만큼 배상 비율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문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절차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당장 내달부터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지만,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만 해도 2~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홍콩H지수 ELS의 조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밟겠단 입장이나, 투자자의 나이, ELS 투자 횟수 등 개인적인 특성을 사례마다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조정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투자자는 39만6,000명(중복 포함)이며 가입 은행에 따른 평균적인 배상 비율도 제각각이다. 분조위의 공식적인 분쟁조정 사례가 충분히 쌓이면 은행들은 이를 참고해 자율배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자율배상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자율배상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선 은행별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 기간만 최소 1개월이 넘을 것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자율배상에 배임 논란이 끼어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실제 최근 금융권에선 자율배상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더라도 배상안에 동의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자율배상은 은행이 분조위나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 이전에 은행 스스로가 과오를 인정하는 일인 데다 은행별로 많게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여곡절 끝에 금융사의 자율배상이 시작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율배상 기준으로 삼을 금융당국 배상안이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다. 은행과 투자자 간에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소지가 충분하다. '금융 지식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 배상 비율이 10%p 낮아지는 점도 주관적인 판단 영역으로 꼽힌다. 당국은 이에 대한 예시로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시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사실상 금융권에 책임 전반을 전가한 셈이라는 볼멘소리가 거듭 쏟아지는 이유다.

금융권 고난사에도, 당국 "배임 얘기가 왜 나오냐"
이처럼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을 두고 금융권 고난사가 이어지는 와중이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불만을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일축했다.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자율 배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상 피해자가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 아래 배상안을 만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 배상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금융권은 분기탱천하는 모양새다. 애초 배임 우려 소지를 원천 봉쇄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마저도 '떠넘길' 셈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은 "구체적인 제재 근거도 없이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에 나서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결국 배상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논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 또한 "불완전 판매 여부가 채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덜컥 배상부터 나서면 향후 배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또 자율배상을 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꼴인데, 그럼 향후 당국으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단위 '과징금 폭탄' 압박, "결국 자율 배상 이뤄질 듯"
다만 각종 논란이 산재해 있음에도 결국 자율 배상이 차차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다. 배상을 회피하다간 도리어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가)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며 선제적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의거해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금융회사에 ELS 판매 금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이 금소법 시행 후 판매한 ELS 규모가 17조원가량인데, 이 중 불완전판매 사례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조 단위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선 결국 당국이 내건 과징금 경감 인센티브가 금융권의 울며 겨자먹기식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건, 판매액이 15조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ELS에 대해선 7조5,000억원(약 57억 달러)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권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부담을 안을 바에야 자율 배상을 시행하는 게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금융권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사태가 일단락될 여지가 많아진 만큼, 정부 입장에선 당분간 금융권의 불만 누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