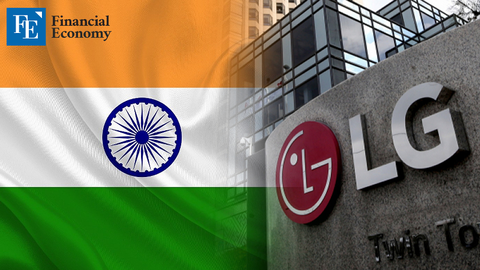금융감독원, 농협금융 ‘지배구조’ 정조준 “중앙회 부당개입 집중 점검”
입력
수정
금감원, 농협금융 정기검사 착수 예정, 내부통제·지배구조 중점
투자증권 인선 놓고 '중앙회-금융지주' 갈등, 해묵은 문제 재부상
중앙회가 지분 100% 보유, 독특한 '지배구조' 민낯 드러낸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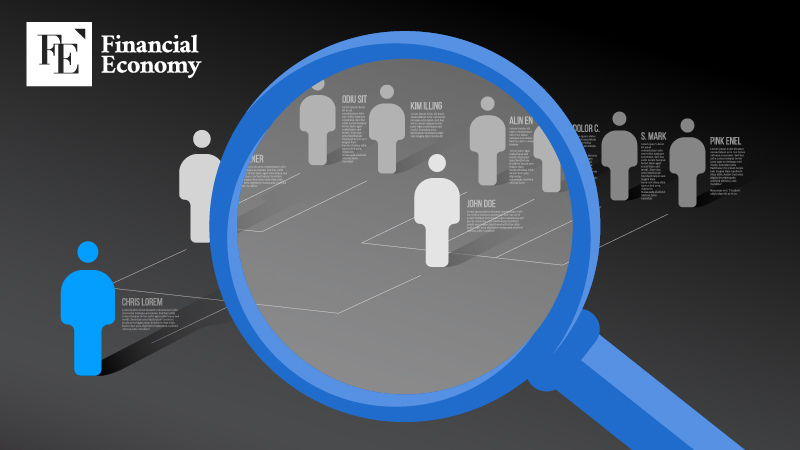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농협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와 NH투자증권의 대표이사 인선 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모두 농협금융지주의 특수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은 이미 십여 년 전 조직혁신을 통해 신용·경제 부문이 분리됐음에도 여전히 지배구조 면에선 후행적 행태가 답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가 농협금융지주를 넘어 중앙회까지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금감원,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 검사 예고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정기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계열사로 옮기는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검사에서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를 정점에 둔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메스를 댈 전망이다. 또한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도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세부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빨라야 하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가 종료된 뒤 내부보고를 거쳐, 농협금융과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 측 소명을 듣고 조치안이 나오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리는 수순으로, 검사 종료 이후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잇단 배임 사고-인선 갈등, 원인은 독특한 지배구조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에도 농협금융과 계열사인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통상 금감원의 대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이달이 검사 도래 주기인 점을 고려하면 3월에 행해진 전방위적 검사는 이례적인 조치였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감원이 농협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는 이유는 여타 금융그룹들과는 다른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100% 출자하는 방식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가 나눠지는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실행했다. 금융 계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농협의 신경분리는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상 금융지주와 그 자회사에 대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중앙회의 금융지주 인사권·경영권 개입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돼 전문성 없는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주류였다.
금감원은 이같은 구조적 특수성이 최근 발생한 배임 사고를 촉발시켰다고 보고 있다. 비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융 사고까지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농협은행의 한 지점 대출 담당 직원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약 4년 8개월 동안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액수도 타 은행 대비 많은 수준이었다.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을 놓고 불거진 내홍도 농협의 지배구조와 무관치 않다. 해당 사태는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전문성을 내세운 증권사 내부 인사를 추천한 반면,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증권사 이력이 없는 중앙회 출신 인사를 밀어주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사태는 이석준 회장의 추천 인물이 최종 선임되면서 일단락됐으나, 중앙회와 금융지주의 해묵은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현행 지배구조, 농협금융지주 경쟁력까지 약화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같은 지배구조가 농협금융지주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부분은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과다 책정’이다. 농지비는 농업인 지원을 명목으로 농협중앙회가 매년 거둬가는 분담금으로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배당금 3조8,566억원, 농지비 4조7,587억원을 합해 총 8조6,153억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농협금융지주의 누적 당기순이익(17조8,349억원)의 무려 48.3%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는 4,927억원을 걷었는데 이는 농협금융 순이익(2조5,774억원)의 20%에 달한다.
문제는 과도한 농지비와 배당금이 농협금융의 손실흡수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농협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88%로, KB금융(13.58%)과 하나금융(13.22%)은 물론 평균(12.9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무 건전성 우려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농지비의 경우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농협금융 계열사인 농협생명은 1,1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농지비 628억원을 내야 했다.
수익성 역시 갉아먹고 있다. 지난해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은 농지비 차감전 기준으로는 우리금융보다 앞섰으나, 농지비 차감 후 순이익은 2조2,343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낮았다. 농지비 차감전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농지비는 무려 9.4%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지주는 농지비와 배당금 규모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농협중앙회→농협금융→은행·증권'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상 농협중앙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지비의 수혜를 받는 지역농협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농협금융지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농지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