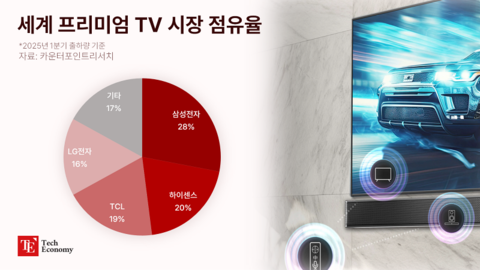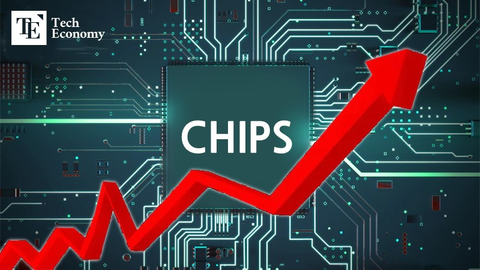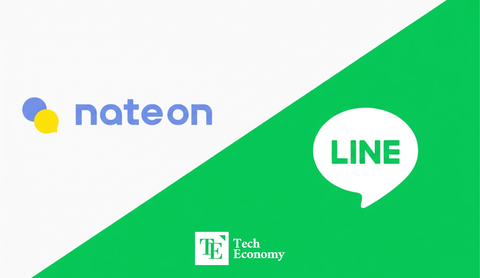만연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금액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입력
수정

심박수 측정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얼라이브코어가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술 특허 침해를 두고 애플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워 창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에 있어 기술 탈취란 사형 선고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기술 탈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애플, 얼라이브코어·마시모 등 기술 탈취 의혹
애플과 얼라이브코어 간의 분쟁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얼라이브코어는 애플과 기술 제휴를 맺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애플워치에 탑재될 심박수 측정 센서를 개발했다. 그러나 2018년 애플은 자체 심전도 센서 기술을 탑재한 애플워치를 출시해 버렸다. 특히 얼라이브코어 소프트웨어가 애플워치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운영체제를 변경하면서 이들의 분쟁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21년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이 △부정맥 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세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TC가 내린 미국 내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승인하며 얼라이브코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얼라이브코어가 완전히 승기를 잡은 건 아니다. 애플 역시 특허 재판 및 항소위원회에 얼라이브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얼라이브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얼라이브코어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애플은 의료 기술 스타트업 마시모와도 영업기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마시모는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센서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에는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애플워치의 수입을 정지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애플 악명 자자해", 애플의 '죽음의 키스'
사실 애플의 악명은 자자하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애플의 관심은 작은 기술 회사들에 죽음의 키스와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애플은 자사의 모든 기술이 자체 개발하거나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애플은 여러 기술 스타트업들에 구애를 펼친 뒤 개발 결과를 복제한 후 원조 스타트업을 버리는 식으로 기술을 탈취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과 중소기업 간 마찰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애플의 수많은 기술 탈취 혐의가 모두 무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앞서 언급한 얼라이브코어, 마시모 외에도 옴니메드사이, 발렌셀 등 피해 기업의 수는 더 많다. 헬스 관련 기술 스타트업인 옴니메드사이는 소장에서 자사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모하메드 이슬람 박사와 자사의 특허 출원 중인 사양을 검토한 결과 애플이 애플워치 심박수 센서에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옴니메드사이의 소송은 생리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광학 기술과 관련된 4개의 특허에 대한 것이다.
발렌셀 또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발렌셀에 따르면 애플은 수차례 기술 정보를 요구했으며 시제품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발렌셀은 애플과 라이선스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애플이 갑작스럽게 논의를 중단시키고 2015년 심장 모니터링을 갖춘 애플워치를 출시했고 밝혔다. 발렌셀은 이듬해인 2016년 애플을 상대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악명 높은 이유는 또 있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보복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이 가진 별개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도를 일삼기도 했다. 애플의 접근은 말 그대로 '죽음의 키스', '죽음의 구애' 그 자체인 셈이다.

국내서도 탈취 사례 많아, 하지만
국내에서도 롯데헬스케어와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VX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를, 카카오헬스케어는 닥터다이어리의 혈당 관리 서비스를,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의 내부망에 접속해 골프장 운영 솔루션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매년 수십 개의 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연간 총피해 금액은 매년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술 우위를 지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중소기업에겐 힘이 없다.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악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중기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은 59개사, 피해금액은 902억원에 달했고 이는 2018년(32개사·1,119억원)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업계에 만연한 기술 탈취, 근절은 불가능한 것일까.
한편 최근 7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된 기술 탈취 신고 건수는 20여 건에 그쳤다.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해도 대부분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로는 ‘입증 어려움’(66.6%), ‘거래관계 유지’(53.3%) 등이 꼽혔다. 소송 비용도 부담이다. 한 완성차 업체의 협력사로서 거래를 이어오다 기술을 탈취당한 비제이씨는 7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며 소송 비용으로만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이 몇십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든다. 그런데 대기업이 협업을 핑계 삼아 기술 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진행시켜 중소기업을 유령기업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대기업이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분쟁 중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열린 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Previous AI는 창작 영역의 침략자?
- Next 넷플릭스, 중남미 이어 2분기부터 영·미 시장도 계정 공유에 과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