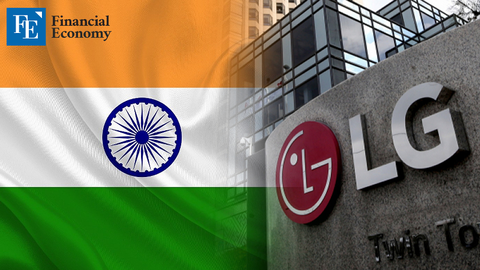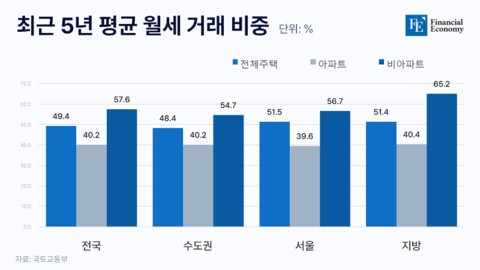[딥파이낸셜] 금융 위기 피해 키우는 ‘은행 생존 본능’
입력
수정
은행들 ‘생존 위한 유동성 확보’ 노력이 금융 위기 피해 키워 기존 모델로는 위기 시 ‘은행 행동 패턴’ 예측 불가 유동성 관리 ‘인공지능 의존’으로 금융 위기 발생 및 확산 속도 가속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금융 위기는 은행들이 ‘수익 추구 모드’에서 ‘생존 모드’로 돌변할 때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 통계 모델로는 위기 자체와 위기 상황에서의 은행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생존 본능이란 내재적이고 자연스러운 성향인 탓에 규제할 수도 없다. 여기에 유동성 관리를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금융 위기의 발생 및 확산 속도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융 위기 시 은행들 생존 노력이 ‘피해 증폭’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본능적으로 수익보다 생존을 우선시한다. 문제는 이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응일 수 있지만, 금융 위기의 피해를 한껏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목표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행동 패턴 중 두 가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000일 중 999일에 해당할 정도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은행들은 차입과 대출이라는 일상적 활동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한 번씩 닥치는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보호’(self-preservation) 모드로 철저히 돌변하게 된다. 유동성을 비축하고 대출을 중단함으로써 예금 인출 사태와 자산 매각, 신용 동결로 이어지는 금융 위기를 촉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존을 위한 은행들의 행동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상황을 가정한 통계 모델로는 예측조차 어려워 투자자와 규제 당국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유동성 확보 노력이 ‘자산 매각’ 및 ‘예금 인출 사태’ 불러
위기는 드물지만 갑작스럽기도 하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OECD 국가의 경우 43년에 한 번씩 시스템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떠한 경고도 없는 돌발성은 비유하자면 평화롭게 잠들어 대혼란 속에서 잠을 깨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위기의 최대 국면에서 은행의 최우선 순위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중앙은행 지급준비금(central bank reserves)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교체하는 일이다. 2007년 금융 혼란 시에도 은행들은 재빠르게 유동성 확보에 나섰고, 이것이 자산 매각과 예금 인출 사태를 불러 유동성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물론 경제 전반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상시 ‘수익 극대화 모드’ vs. 위기 시 ‘생존 모드’
은행의 일상 영업 활동과 고비 시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차이는 두 가지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평상시의 ‘수익 극대화 모드’와 위기 상황에서의 ‘절박한 생존 모드’가 그것이다. ‘부도 위기가 아니면 수익 극대화에 주력한다’는 표현이 은행들의 이러한 ‘이중성’을 잘 표현해 준다. 하지만 이것이 금융 위기 리스크 산정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은행 이중 행동 패턴’은 위기 시 금융 시스템 내 역학 관계를 180도 변화시킨다. 또한 각각의 금융 위기가 제기하는 리스크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 자산 가격의 예측도 불가능해 이전의 예측 모델들을 쓸모없게 만든다. ‘위험 가치’(Value at risk, VaR, 투자 자산 손실 예측 모델)나 ‘예상 부족분’(expected shortfall, 보수적인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추정) 모델은 자주 발생하는 사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드물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금융 위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모델 환각’(model hallucination, 예측 모델이 생성하는 부정확한 결과)은 정상 시 데이터로 비상시 행동을 추론하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난다.
정상 상황 가정한 모델로 위기 예측 불가능
기존 모델들의 한계는 위기가 지난 후 리뷰 과정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한 고위 의사 결정자는 ‘결국 쓸모없는 모델에 매달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상 상황을 가정한 모델로 위기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실감하게 해준다.
이렇게 ‘은행 이중 행동 패턴’은 금융 시장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킨다. 과도한 부채와 유동성 의존이 금융 위기를 부르는 근본 원인이지만,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은 은행들의 자기 보호 행동인 것이다. 부채와 유동성 문제는 거시 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를 통해 규제가 가능하지만 자기 보호 행동은 본능이기 때문에 통제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엄격한 규제가 위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규제 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획일적인 리스크 산정 기준이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은행들의 집단 행동을 불러 시장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 기관들이 충격에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자산 가격 급락과 손실을 감수한 자산 매각이 앞다퉈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때도 악순환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의존이 위기 확산 속도 ‘부채질’
유동성 관리를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경향도 해당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유동성 관리 책임을 지는 재무 부서들은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의 빠른 대응 능력 때문에 이전 위기들의 확산 속도를 뛰어넘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이다. 점점 빨라지는 의사 결정 속도는 앞으로의 금융 위기를 더 갑작스럽고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단 하나의 통계 처리(stochastic process) 모델로 모든 상황에서의 은행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은행은 두 가지 상반된 행동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일상의 수익 극대화 모드와 위기 시 생존 모드가 그것이다. 정상 시 축적된 데이터로는 위기를 예측할 수도, 은행들의 행동을 예견할 수도 없다. 위기가 발생한 후 생존 본능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학 관계는 위기 전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 이중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이 금융 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존 본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존 다니엘슨(Jon Danielsson) 교수는 런던 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시스템 리스크 센터(Systemic Risk Centre) 소장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one-in-a-thousand-day problem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