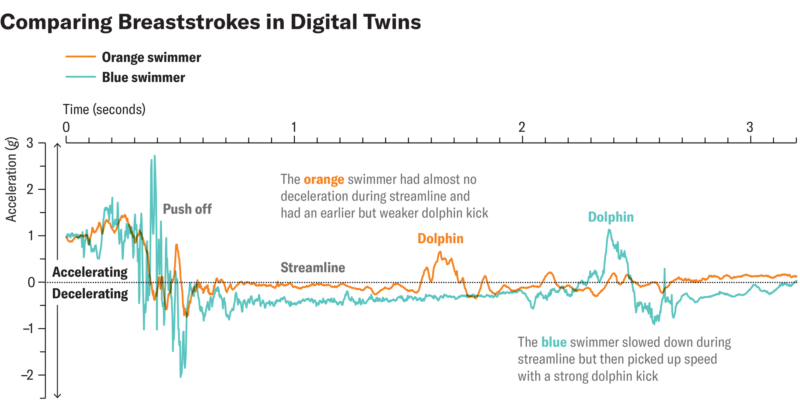넷마블 지분 매각한 CJ ENM, 비핵심 자산 유동화-기초 체력 키우기 일환인 듯
입력
수정
올 1분기 CJ ENM 부채비율 146.4%, 결국 넷마블 주식 일부 매각
적자 전환 넷마블에 시장선 전량 매각·텐센트 매각 등 거론되기도
CJ라이브시티 폐업 가능성↑, "넷마블 지분 매각으로 채무 정리"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 지분 5%를 처분하면서 2,50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지난해 비영업자산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자산유동화에 나서며 재무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번 넷마블 주식 처분도 실적 악화로 인해 진행 중이던 비핵심 자산 유동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CJ ENM, 넷마블 주식 5% 2,501억원에 처분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ENM은 보유 중이던 넷마블 주식 429만7,674주(전체 발생 주식의 5%)를 2,501억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며, 처분 이후 CJ ENM의 넷마블 보유 지분은 16.78%로 감소한다. 주식 처분과 함께 양수인인 거래 상대방과 주가수익스왑(PRS) 계약도 체결했다. 10일 종가인 주당 5만8,200원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해당 지분을 매도할 시 매도 금액과 정산기준금액 차액을 정산한다는 게 골자다.
CJ ENM의 넷마블 지분 매각은 회사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CJ ENM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88.91%에서 올 1분기 말 146.4%까지 치솟았다. 순차입금도 현재 2조원을 넘기며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앞서 시행한 대규모 투자의 영향이다. CJ ENM은 지난 2022년 미국의 영화 제작사 '엔데버 콘텐트(현 피프트시즌)' 지분 80%를 1조원에 인수한 이후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피프트시즌'을 출범시켰다.
다만 대규모 투자 감행 이후 실적이 악화하면서 이를 받쳐줄 기초 체력이 고갈됐다. CJ ENM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46억원이었으며, 3,9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CJ ENM은 지난해부터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분기엔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0.2%, 196억원)과 LG헬로비전(1.5%, 51억원)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바 있고, 같은 해 8월엔 하이브와 합작해 만든 빌리프랩 지분 51.5%(1,500억원)도 매각했다. 콘텐츠제작사인 에이스토리 지분 역시 일부(1.24%, 24억원) 처분했다. 이번 넷마블 지분 매각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적자 이어 온 넷마블, 시장선 지분 전량 매각 점쳐지기도
시장에선 이미 2022년부터 넷마블 지분 매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넷마블이 실적 악화로 인해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넷마블은 2022년 4분기 198억원의 영업손실을, 연간으로는 1,0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2022년 당기순손실은 총 8,170억원에 달했다. 이에 넷마블의 공매도 비중은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넷마블이 2022년 잠정 실적을 발표한 지난해 2월 9일부터 22일까지 넷마블의 공매도 비중은 21.5%였다. 전체 거래량 331만7,799주 중 71만3,910주가 공매도였던 것이다.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CJ ENM은 넷마블의 잠정 실적 발표와 비슷한 시기 컨퍼런스콜을 진행하며 "부채비율 상승과 순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과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올해 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CJ ENM이 에이스토리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한 것도 이 시점이다. 시장에서 CJ ENM의 넷마블 지분 전량 매각이 점쳐진 배경이다.
일각에선 CJ ENM이 중국 텐센트를 전략적 투자자(SI)로 끌어들여 넷마블 지분을 텐센트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텐센트는 한리버인베스트먼트(Han River Investment PTE. LTD)를 통해 넷마블 지분 1,505만7,800주(17.52%)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과 텐센트의 지분율 차이가 6.6%(2022년 3분기 말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CJ ENM이 텐센트에 일부 지분을 넘기면 넷마블의 최대 주주는 방준혁 의장에서 텐센트로 바뀔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게임 산업 흐름에서 텐센트는 계속 M&A를 추진 중"이라며 "실제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CJ ENM이 SI에 지분을 넘긴다고 결정하면 텐센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B 발행 등 대체 방안 찾던 CJ ENM, CJ라이브시티가 도화선 됐나
그러나 당시 CJ ENM은 넷마블 지분 매각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 헐값에 처분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대신 CJ ENM이 선택한 건 교환사채(EB) 발행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CJ ENM은 복수의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넷마블 지분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 방안을 검토했다. 넷마블 보유 지분을 활용해 재무 부담을 해소할 대체 방안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넷마블 지분을 활용해 EB를 발행해도 자금 확보가 용이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EB는 교환 대상 주식의 향후 상승 가능성을 담보로 낮은 금리에 사채를 발행하는 메자닌으로 통한다. 당시 장중 넷마블 주식은 약 4만1,000원 선이었고, CJ ENM의 보유 지분 가치는 당시 기준 8,000억원 아래였다. 더군다나 지난 수년간 주가가 부진했던 터라 상승 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CJ ENM 입장에선 넷마블 지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올해 넷마블 지분을 일부나마 매각하고 나선 건, 최근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폐업 수순에 접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당초 CJ라이브시티는 경기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사업 시행을 맡고 있었다. K-컬처밸리는 경기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부대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해당 사업에 7,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을 최종 무산됐다. 경기도가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선 CJ라이브시티가 폐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CJ라이브시티가 폐업하기 위해선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CJ ENM의 CJ라이브시티 외부차입 등 지급보증 규모는 약 4,6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CJ ENM은 이번 넷마블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활용할 것"이라며 "법인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