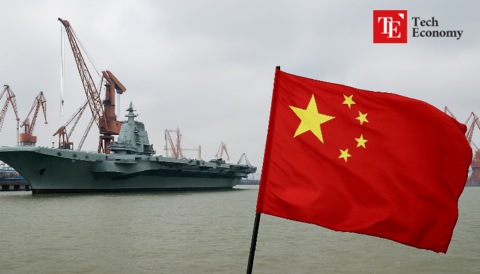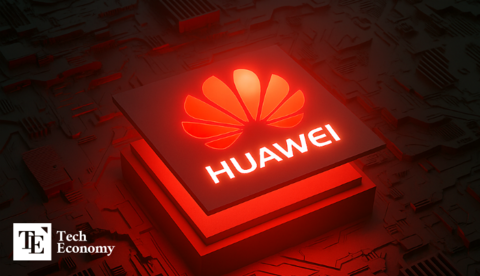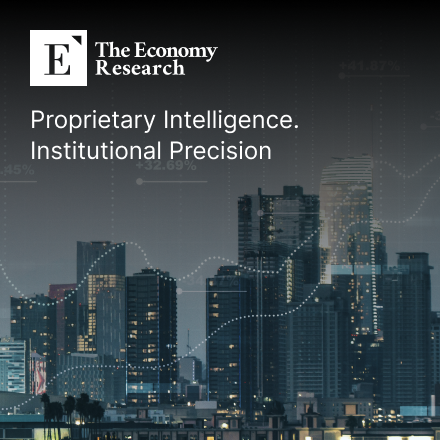'알테쉬' 샌들·모자서 유해 물질 검출, 최대 기준치의 229배 초과
입력
수정
서울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제품 144건 안전성 검사
총 11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검출
해외 직구 안전성 보장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에서 판매하는 샌들, 모자, 네일, 냄비 등 11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식품 용기의 경우 지난달에도 법랑 그릇 등에서 납, 니켈 등이 검출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적으로 확인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제품인 데다 기준치의 299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 초과
14일 서울시는 8월 3주차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11건의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 기관 3곳과 함께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알테쉬에서 판매한 샌들 4종과 모자 3종 등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샌들 제품 중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모자 3종은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로 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또 모자 제품의 겉감은 pH 9.3으로 기준치(4.0∼9.0)를 넘어섰다. 알루미늄 냄비 2종은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했고, 식품 용기의 경우 지난달 법랑 그릇 6종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데 이어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네일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0.275%)이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소화기계·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해외직구 금지안' 사실상 철회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이 잇따르자, 국가통합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원천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로 한 제품 중에는 아동 의복, 유아용 차,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의자, 침대, 보행기 등 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이 포함됐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정책 발표 하루 만에 해외 직구 금지안에 대해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이후에도 해외 직구로 들여온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해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내 검사 결과들이 나오자, 안전성 인증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안전성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와 영업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해외 직구 제품만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거래되고 있어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철회한 이후 최근 2개월 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안전 인증 없는 중국산 제품,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KC인증 1건에는 최소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 검증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 가격대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KC인증까지 최소 2~3개월의 시용이 필요하다. 만약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4~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태반이다. 게다가 검사에 드는 시간적·물리적 비용은 모두 제품 원가에 반영된다.
반면 중국산 제품은 국내산에 비해 원가가 낮은 데다 검사 비용도 들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법을 지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는 불공정한 구조인 셈이다.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9.1%가 해외 직구 확산으로 피해로 "국내 인증 준수 기업의 역차별"을 꼽았다. 또 응답의 42.5%는 "직구 상품의 국내 인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인증이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과거 라돈 매트리스, 가습기 살균제, 슬라임, 아기 욕조 등은 인증을 받았음에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인증을 받더라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관 과정에서 일일이 KC 미인증 제품을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KC인증을 유일한 안전 기준으로 두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업계에서는 KC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